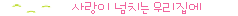|
외톨박이-'당신은 개새끼야' "한수 가르쳐 다오." 시인 최돈선이 우리 집으로 놀러 오면 나는 가끔 바둑판을 펼쳐 놓고 그의 눈치부터 살피곤 한다. 그는 심심해서 나한테 놀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놀러 오는 것이다. 내가 보고 싶어하기만 하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는 나타나 주곤 했었다. 내가 바둑을 두자고 하면 시인 최돈선은 귀찮을 것이다. 내 바둑 실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오급이나 육급 짜리들과 맞두어서 제법 팽팽하다 싶을 정도인데 시인 최돈선에게는 아홉점이나 갖다 붙여도 판판이 깨지고 만다. "누가 물으면 한 십급 쯤 된다고 말해라" "설마!" "자존심이 상해서 못 견디겠으면 한 칠 급쯤 된다고 말하든지." "고무줄 급수로군" "네 바둑은 그래." 까마득한 실력이니까 아직 급수 따위를 따져 볼 입장도 못 된다는 뜻이리라.나는 그만 약이 바짝 올라서 이번만은 그 치욕스러운 아홉점에서 여덟 점으로라도 내리고야 말겠다는 결심을 굳힌다. 말이 아홉점이지 바둑판 전체가 새까매 보인다. 거기에 들어 와서 단칸 세방살이는 고사하고 발붙일 자리조차 없을 것 같은데 지다니 말이 안되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만방으로 이겨서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어야지.' 나는 바둑판을 들여다보며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어 보이기 일쑤였다. 두기 전에는 언제나 자신만만했었다. "바둑을 배우기 전에 먼저 인간을 배우도록 해라." 그는 언제나 바둑판 앞에서 내게 그렇게 말한다. 하지만 오늘은 내가 말하리라. "그대는 인간을 배우기 전에 먼저 패자의 아픔을 배우라." 그러나 이십 분 정도가 지나면 나는 안다. 오늘도 만방으로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기는 틀려먹었다는 사실을. '서너 집만이라도 이기자. 한 집을 이겨도 이기는 건 이기는 거니까. 세 판을 내리닫이로 이겨 버리면 아홉 점에서 여덟 점으로 내려 갈수가 있지 않느냐. 오늘은 여덟 점으로 만족을 하고 다음번에는 분발해서 다섯 점 정도로 왕창 줄여 버리마.' 나는 스스로를 그런 식으로 격려하기에 이르른다. 그러나 삼십 분이 지나면 나의 소박한 꿈마저도 가망성이 없어져 버리고 만다. 좇기는 듯이 보이던 시인 최돈선의 대마가 돌연히 방향을 바꾸어 내 대마의 옆구리에다 날카로운 송곳니를 박아 넣으면서 국면은 백팔십도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내가 만들어 놓은 대도시가 무참히 허물어지고 공설 운동장처럼 드넓던 나의 대지들은 시인 최돈선의 무허가 건축물들로 하나 둘 들어차서는 이제는 괜히 바둑을 두자고 말했다 싶은 생각까지 들게 되는 것이다. "친구 지간에 정말로 너무 하는구나야!" 나는 내심 분노를 애써 감추며 이제는 한 두 채 남은 판자집에다 힘주어 못질을 하며 그것이나마 몇 채 지어 볼 수 있었던 자신을 참으로 대견하다고 자위하는 수밖에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르게 되는 것이다. "나쁜 놈!" 나는 귀엽고 새까만 나의 바둑돌들이 그의 관대하지 못한 수법에 속수무책으로 잡아먹혀서 이제는 껍질만 남아 그의 무릎 앞에 수북히 쌓여 있는 것을 바라보며 비로소 내가 그의 바둑친구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연히 깨닫게 되는 것이다. 물론 더러는 그가 아주 불리한 국면에 처해서 바둑판 위에서 쩔쩔매는 꼴을 볼때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나는 아직 한번도 그가 바둑판위에서 좌절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불리한 국면을 헤쳐나가는 방법 중의 하나로 그는 패를 교묘히 이용하곤 하는데 패가 한 두개면 나도 버티어 볼 자신이 있다. 그러나 그가 패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서너군데나 만들어 놓고는 멀쩡한 정신을 가진 상대편을 일대 혼란에 빠뜨려서 우왕좌왕 갈피조차 잡을 수 없도록 만든다. "졌다." 내가 그에게서 배우는 궁극적인 묘책은 돌을 던지는 법이다. 내가 그를 처음 만난 것은 대학 이학년 때였고 그는 지독하게 우을하고 외로워 보이는 시인이었으며 왜 자살을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궁지에 몰아 붙여져 있었다. 우리는 공통분모가 많아서 만나자마자 자취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단 하루도 술을 거른 적이 없었다. 마시면 취했고 취하면 자주 울었다. 나는 겉으로 소리내어 울었지만 그는 속으로 소리죽여 울었다. 그 당시 우리가 추구했던 삶이란 그리 엄청난 것도 아니었다. 모두가 정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하는 것이 우리들의 희망이었고 그런 세상속에서 최소한 굶지 않고 시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몫을 가지는 것이 우리들의 꿈이었다. 이제 우리는 최소한 굶지 않고 시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꿈을 실현했다. 그러나 모두가 정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나는 가끔 세상을 향해 팔뚝질을 하고 더러난 가래침도 뱉는다. 그러나 시인 최돈선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히히히" 그는 자주 그렇게 웃어 버린다. 누가 물으면 '십급 쯤 됩니다.'라고 말해야만 될 사람들이 맞두자고 대들 때에도 그는 그렇게 웃어버린다. 나는 세상을 맞수로 보는데 그는 한 십급 쯤으로 밖에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세상살이를 마다하지 않는다. 그가 나와 바둑을 두는 일은 정말로 재미가 없을 것이다. 노동 중에서도 중노동일 것이다. 하지만 그는 사양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그는 세상을 너그럽게 대한다. 중노동을 강요해도 히히히 웃으면서 살아간다. 그는 이미 노장을 알고 부처를 알고 예수를 알고 신선을 안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슴 안에다 불러 앉히고 노닐 줄 안다. "당신은 개새끼야" 간혹 그가 선배들에게 술취해 그렇게 말해도 그의 선배들은 화내지 않는다. 그의 가슴속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가슴속에는 단 한 마리의 개새끼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가슴은 한없이 투명해서 바깥 세상에 있는 어떤 개새끼도 그 속에 일단 들어가면 투명해져 버린다. 그는 나 보다 한 수 위가 아니라 아홉 수 정도, 아니면 그 보다 더 위다. 재능이 아니다. 마음이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정답게 살아갈 수 만 있다면 시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의 하나다. 모두 정답게 살아가는 세상이 있다면 그 자체가 바로 시이며 그림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아직 세상은 멀었다. 시인 최돈선처럼 마음이 투명한 사람이 많이 살면 모두가 정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는 바둑에 져도 몹시 기분이 좋아 보인다. "히히히" 지는 것이 저렇게도 즐겁나 싶을 정도다. 최근 동문선이라는 출판사가 삼 년 동안 끈질기게 좇아 다나면서 그에게서 가을날 찬물에 씻긴 모래알처럼 깨끗하고 눈부신 산문들을 얻어내어 '외톨박이'라는 책을 하나 내었다. 벌써 오판이나 찍었다고 한다. 거기에 보면 이런 바다엽신 두 줄이 눈길을 끈다. 사랑하는 사람아. 이렇게 첫머리를 쓰고 목이메어 울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세상은 알아주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아, 이렇게 첫머리를 쓰고 목이 메어 우는 사람은 이제 드물어졌다. 하지만 그는 강원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모아 놓고 사랑하는 사람아, 이렇게 첫머리를 써 넣고 목이 메어 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친다. 세상이 바둑판이다. 그러나 사석들로 가득차 있다. "바둑을 배우기 전에 먼저 인간을 배우도록 해라." 져도 히히히 웃을 때까지, 세상 모든 개새끼들이 투명해질 때 까지, 사랑하는 사람아 이렇게 첫머리를 써 놓고 목이 메어 울 때까지. 비록 지금은 축에 몰려 살더라도 돌을 던지지 말고 인간을 배워 나갈 일이다. (이외수 1986년) |
'즐거운 생활 > 바둑,오락' 카테고리의 다른 글
| [Photo]썬글래스에 비친 바둑 (0) | 2007.09.18 |
|---|---|
| [성석제]내가 나를 1급이라 부르자 1급이 되었다 (0) | 2007.09.18 |
| 이창호, 중환배 우승에 힘입어 랭킹 1위 사수! (0) | 2007.09.03 |
| 랭킹1위 이세돌, 진정한 일인자인가? (0) | 2007.07.29 |
| 일지매 유창혁 (0) | 2007.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