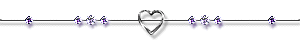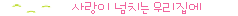|
한 주 동안 출장을 다녀왔더니 사무실 책상에 청첩장이 석 장이나 놓여 있다. 청첩장의 디자인이 하나같이 막 피어난 철쭉이나 튤립꽃잎처럼 예쁘다. 더러는 거르는 때도 있지만 이렇게 쏟아지는 청첩장 때문에 때로는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그동안 우리 집 경조사에 부조를 해 주신 분들이 여간 많아서 부지런히 갚아도 생전에 다 못 갚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떤 때는 아득할 때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일일이 다 챙기자니 살림이 휘청거릴 것 같고 모른 체하자니 사람 노릇이 아닌 것 같아서 말이다. 정호승 시인도 내 심정이나 다르지 않은 때가 있었던 모양이다. 그의 수필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부채냐 선물이냐
“축의금은 자기의 위세인지 깊은 마음의 우정인지, 몇 년 전 우리 아들 결혼식 때 친구가 축의금을 100만 원이나 하였기에 그때는 친구에게 참 고마운 마음을 가졌다. 그런데 며칠 전 친구로부터 아들 결혼 청첩장을 받고 보니 축하의 마음보다 걱정이 앞섰다. 늘 하루하루 살기에도 빠듯한 삶이기에 어떻게 축의금을 마련할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마누라와 상의해 보니 축의금은 빌려서라도 내가 받은 만큼 해야 하며, 축의금은 축하의 돈이기 이전에 받은 만큼 반드시 갚아야 하는 돈이라고 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급하게 돈을 빌려서 기쁜 마음으로 식장에 갔는데 친구는 연신 ‘와 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바쁜 틈에도 나의 안부까지 물어 주기에 나는 돈을 빌려서라도 참 잘 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며칠 후 등기 우편이 배달되었다. 며칠 전 아들 결혼식을 치렀던 친구한테서 온 것이었다. ‘웬 인사장을 등기로 보냈는지.’ 하면서 뜯어 읽어 봤더니 글씨가 눈에 익은 친구의 편지였다. 친구는 ‘이 사람아! 자네 살림 형편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축의금이 뭐냐.’는 말과 함께 ‘우리 우정을 돈으로 계산하느냐.’면서 90만 원의 자기 앞 수표를 보내왔다.
‘이 사람아, 나는 자네 친구야. 자네 형편에 100만 원이라니, 우리 우정에 만 원이면 족하네. 여기자네 성의를 생각해서 10만 원만 받고 90만 원 돌려보낼 테니 그리 알게. 이 돈을 받지 않으면 친구로 생각하지 않겠네.’
그리고 친구는 ‘힘든 삶에 결혼식에 참석해 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과 함께 ‘틈이 나면 옛날 그 포장마차에서 어묵에 대포 한잔 하자.’는 말을 덧붙였다”
(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 준 한마디, 정호승 저, 비채).
부조금이 그저 주는 사람 맘대로 주든지 말든지 할 선물이냐, 아니면 반드시 갚아야 할 부채냐 하는 문제로 말거리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원래 부조금(扶助金)이라는 말은 상부상조(相扶相助)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일 것이다. 오래전 우리네 생활에서 지연(地緣)이나 혈연(血緣)을 통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품앗이가 바로 그것이다. 품앗이가 일손에 관한 것이라면 부조금은 일종의 금융과 같은 것이다.
집안에 큰일이 생겨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서로 돕는 보험의 원시 형태라고도 할 수 있다.이 경우 남에게서 받았으면 자기도 당연히 갚을 줄 아는 것이 사람의 도리다. 자기만 받고 남의 일에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상종 못할 사람이나 하는 짓이라고 따돌림을 받는 것이 우리의 인심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축의금은 분명히 부채다. 그래서 우리 세법(稅法)에서도 부조금은 부채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매길 수 없다는 결론이 이미 나 있는 상태이다. 단지 그 액수가 상식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긴 하다. 그런 한편으로 청첩장이 액수를 적은 고지서가 아니어서 자기 형편에 따라 축하나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라 한 데서 틀렸다고 대들 사람은 없다.
둘도 없는 친구의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데 어찌 모른 체한단말인가? 축하는 하러 가야겠고 한날, 한시에 세 곳씩 갈 재주가 없으니 아내와 심지어는 아이들까지 동원해서 축의금을 전달만하는 경우도 있고, 그도 아니면 그 근처 사는 다른 친구에게 연락해서 대납(代納)을 하고 송금해 주는 경우도 심심치 않다.
한번은 기를 쓰고 갔다가 식장이 하도 붐비는 바람에 정작 주머니에 담고 간 축의금을 깜박 잊고 그대로 담아 온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축의금과 같은 주머니에 넣고 간 다른 봉투를 바꿔 넣고 온 황당한 경우도 있어서 아내에게 한바탕 구박을 받은 적도 있다.
나도 여러 번 집안에 일이 있어서 그때마다 목이 메도록 고마운 사연이 한둘일까마는 <연탄불>의 작가 이철환 씨의 수필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냥 맨눈으로 읽기에는 너무 물기가 많다.
축의금 1만 3천 원
“10년 전 나의 결혼식이 있던 날이었다. 결혼식이 다 끝나도록 친구 형주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식장 로비에 서서 오가는 사람들 사이로 형주를 찾았지만, 형주는 끝내 보이지 않았다. 바로 그때 형주 아내가 토막 숨을 몰아쉬며 예식장 계단을 허우적허우적 올라왔다.
‘철환 씨, 어쩌죠? 고속도로가 너무 막혔어요. 예식이 다 끝나버렸네….’ ‘왜 뛰어왔어요? 아기도 등에 업었으면서…. 이마에 땀 좀 봐요.’ 초라한 차림으로 숨을 몰아쉬는 친구의 아내가 너무 안쓰러웠다.
‘석민이 아빠는 오늘 못 왔어요. 죄송해요.’ 친구 아내는 말도 맺기 전에 눈물부터 글썽였다. 엄마의 낡은 외투를 덮은 등 뒤의 아가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친구가 보내온 편지를 읽었다. ‘철환아! 형주다. 나 대신 아내가 간다. 가난한 내 아내의 눈동자에 내 모습도 함께 담아 보낸다. 하루를 벌어야지 하루를 먹고 사는 리어카 사과 장사가 이 좋은 날, 너와 함께할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사과를 팔지 않으면 석민이가 오늘 밤 분유를 굶어야 한다.
철환이 너와 함께할 수 없어 내 마음이 많이 아프다. 어제는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사과를 팔았다. 온종일 추위와 싸운 돈이 13,000원이다. 하지만 슬프진 않다. 나 지금, 눈물을 글썽이며 이 글을 쓰고 있지만 마음만은 너무 기쁘다. ‘철환이 장가간다…. 철환이 장가간다…. 너무 기쁘다.’
아내 손에 사과 한 봉지 들려 보낸다. 지난밤 노란 백열등 아래서 제일로 예쁜 놈들만 골라냈다. 신혼여행 가서 먹어라. 친구여! 이 좋은 날 너와 함께할 수 없음을 마음 아파해다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 해남에서 형주가.’
편지와 함께 들어 있던 축의금 만 삼천 원…. 형주가 거리에 서서 한겨울 추위와 바꾼 돈이다. 나는 겸연쩍게 웃으며 사과 한 개를 꺼냈다. ‘형주, 이놈! 왜 사과를 보냈대요. 장사는 뭐로 하려고….’
씻지도 않은 사과를 나는 우적우적 씹어 댔다. 왜 자꾸만 눈물이 나오는 것일까? 새신랑이 눈물 흘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참아도 참아도 터져 나오는 울음이었다. 참으면 참을수록 더 큰 소리로 터져 나오는 울음이었다. 어깨를 출렁이며 울어 버렸다. 사람들 오가는 예식장 로비 한가운데 서서…”
(이철환, <좋은사람좋은글> 2월 호). |
'행복의 정원 > 생활글 '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목숨 걸고 노력하면, 안되는 일 없다. (0) | 2015.03.15 |
|---|---|
| 노르웨이 어느 어부의 이야기 (0) | 2015.03.05 |
| 어느 神父의 연말 정산 (0) | 2015.02.12 |
| 매력있는 남편 되려면 (0) | 2015.02.12 |
| 장년의 12도(나를 돌아보는 12道) (0) | 2015.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