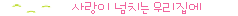|
자식은 부모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현주(시인/수필가)
자식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부모 앞에서는 언제나 어린 자식으로 남아 있기를 원한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이 빨리 자라서 사회에 나가 자립해 살기를 바라며, 늘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도 자신과는 항상 선의의 경쟁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자신이 40세까지 이루어 놓은 사회생활의 업적을 상기 하면서 현재 자기 자식들은 과연 40세까지 어떻게 살아 왔나를 대조하면서 비교도 해 본다. 부모보다 자식이 더 나은 길을 가고 있다고 판단되면 마냥 흐뭇하게 생각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산 세월을 무능하게 처신했던 과거를 되새기며, 반성하는 기회도 가져 보곤 한다.
그렇다면 자식은 과연 부모에게 어떤 존재일까? 늙어가는 부모에게는 늘 울타리가 되어 주는 것이 자식이며, 주위 사람들이 행여 제 자식 칭찬을 해 주면 밤잠을 설칠 정도로 즐거운 어린애가 되어 버리는 것이 부모다. 자식을 믿고 있으면서도 불혹의 나이가 된 자식이 항상 우물가에 내어 놓은 것 같이 불안하게만 느껴지는 사람도 이 또한 부모들이다. 이래서 80먹은 부모가 출근하는 60먹은 자식한테 차 조심을 시키고 있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가? 이런 마음을 언제나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식한테는 간섭하는 것으로 보일까봐 애써 외면하고 무관심 한 척, 위장하고 사는 사람도 부모다. 우리 자식들은 자주 안부전화를 거는 편인데 요 며칠 사이 막내딸 이외 두 아들한테서는 연락이 없어 단단히 벼르고 있던 참이었다.
밖에서 일을 보고 집으로 들어오려고 주차장에서 막 차를 빼고 있을 때, 둘째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다. “너 오래간만이구나!” 내 볼멘소리에 “아버지,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하는 말에 우선 불길한 예감이 들어 맥부터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내용은 큰아들이 갑상선암 수술을 했는데 초기라 성공적으로 잘 끝내고 병실로 와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보고 싶을 것이니 가보라는 전갈이다. 우선 암이라는 그 단어가 기분 나쁘게 들렸다. 그리고 그 동안 두 아들한테서 연락 없었던 것을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집 사람한테 가볼 곳이 있으니 준비 하고 있으라는 전화를 걸고 집에 도착하니 눈치 빠른 집사람은 벌써 표정이 굳어 있다. 자세한 것 알고 싶으면 둘째한테 연락해 보라고 하니 “부모님 걱정 끼쳐 드릴까봐 그동안 비밀로 했다.”고 말하며, 수술이 잘 되어서 이제야 연락 드렸다는 설명이다.
자식들 의도는 좋다 하나 이 문제를 부모인 나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 주어야 우리 내외가 설득력 있게 들을 수가 있을까? 여기서도 부모 자식 간의 존재감에 대해서 재고해 보게 된다. 병실에 누워있는 아들을 바라본다. 집사람은 수술 받느라고 얼마나 아팠냐고 아들을 붙잡고 운다. 그 동안 부모 걱정할까봐 이야기도 안 하고 여러번 검사 끝에 수술 하느라 마음고생이 컸던 것이 더 딱하게 느껴진다고 한탄 한다.
이 자리에서 부모의 생각은 우리가 너무 오래 살아서 자식 아픈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책감부터 몰려와 주체 할 수가 없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된다. 과연 “자식은 부모한테 어떤 존재인가?”를 또다시 떠 올리게 한다. 이 자리에서 나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내 부모님 생각을 해 본다.우리들이 자랄 때, 귀한 눈깔사탕을 동네 아주머니들이 우리 어머니 입에 넣어주면 행여 그것이 입에서 녹을까봐 빨리 집으로 와 물로 씻어서 우리 입에 넣어 주셨다. 밥상에 생선이라도 올라오면 자식에게 먹이느라 당신 입에는 한 점 들어가는 것을 못 보았다.
어머니는 사탕도, 맛있는 생선도 못 먹는 분으로 알고 살다가 철이 들고서야 잘 잡수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늙어, 치아가 부실하고 소화 능력이 없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그림의 떡이 되어 버린 후였다. 아버님은 늘 무서운 분으로만 느끼면서 살았다. 어릴 때, 내가 열이 오르고 아파서 인사불성이 되어 있을 때, 아버지가 나를 업고 20리나 되는 병원으로 뛰어 갈 때, 아버지 등이 참 따뜻하다는 느낌을 받으며 정신을 잃었는데 그 후 이틀 만에 깨어난 적이 있었다. 어린 마음에도 그때 무섭게만 생각되던 아버님의 사랑을 희미하게 느껴 본 적이 있다.
군대에 입대 하던 날, 새벽에 집을 나서면서 아버님 방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다녀오겠습니다.”하고 인사말씀을 건넸으나 인기척이 없어 주무시는 것으로 알고 그냥 출발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뒤따라오신 아버지가 생전 처음 내 두 손을 잡고 잘 다녀오라는 말을 건네며 울먹이시던 그 목소리는 평생을 잊지 못하며 산다.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느꼈으며, 그날 이후부터 서로 대화의 장이 트였다고 기억된다. 그 후, 아버지는 나하고 집안 대소사를 의논해서 처리해 나갔으며, 큰살림을 슬기롭게 꾸려 나가는 것을 보고 아버님한테 존경심이 생겼다. 내가 내 아버지한테 존경하는 마음이 스스로 생기듯이 내 자식들도 내가 살아온 길을 살펴보며, 그런 마음이 생기기를 기대하고 있다.
나는 지금 내 아버지와 내가 걸었던 그 길을 지금 내 자식과 내가 그 길을 다시 걷고 있음을 상기 하면서 뒤 돌아보며 살아가고 있다. 다시 한 번 말해 본다. 반대로 말 한다면 부모는 자식한테 어떤 존재로 남아서 생을 마감해야 되는 것일까? 이런 질문에는 어느 부모나 명쾌한 해답을 듣지 못한 채, 우리는 다음 세대로 넘겨주어야 하는 영원한 숙제를 남겨 주면서 이 세상과 이별을 해야 되는 것 아닐까?
|
'행복의 정원 > 생활글 '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행복의 대가(代價) (0) | 2014.01.18 |
|---|---|
| 94세 아내, 63년간 기다린 남편 마침내 돌아오자... (0) | 2014.01.16 |
| 한국인 라이프스타일 (0) | 2014.01.15 |
| 삶의 완성을 위한 유언장 (0) | 2014.01.11 |
| 마지막 10년 의료비 폭탄이 '처량한 노후'를 부른다 (0) | 2014.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