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숫집에서 배우다
강재형 - MBC 아나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
입을 것(衣)과 먹을 것(食) 그리고 살 곳(住)이다.
이 가운데 내게 즐거움을 주는 으뜸은 먹을 것이다.
"(맛있는 걸) 먹기 위해 산다"라는 말이 그래서 낯설지 않다.
그렇다고 미식가는 아니다.
그저, 가리지 않고 잘 먹을 뿐이다.
이른바 '육해공(陸海空)'을 두루 좋아한다.
밥상을 물릴 때 남는 것은 빈 그릇뿐일 때가 많으니 먹성도 좋은 편이다. 언제부터는 들판에 피어난 꽃송이도 툭툭 뜯어 먹는다. 여행프로그램 촬영 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꽃과 풀이 뭔지 배운 덕분이다.
물에서 나는 고기와 바다가 안겨주는 온갖 해산물, 식탁을 풍성하게 채우는 채소류는 내게 '생존' 보다 '만끽'의 수단이기도 하다.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잘 먹지만, 밀로 만든 음식은 썩 내켜 하지 않는다.
수입 밀로 만든 밀가루 음식이어서? 그냥, 쌀밥이 더 좋기 때문이다.
소싯적에 어쩌다 한번 가곤 했던 경양식 집에서 웨이터가 '라이스(밥)'와 '빵' 중에
고르라면 답은 한결같았다. 돈가스에 칼질하면서도 '라이스'를 챙겼으니까.
중국집에 가도 볶음밥을 먹고, 짜장면이나 짬뽕이 당기면 짜장(짬뽕)밥을 주문했다. 이런 내가 얼마 전부터 국수에 푹 빠졌다.
나를 그곳으로 이끈 이는 면발을 좋아했다.
마지못해 따라간 그 집에서 '차가운 멸치 국수'를 맛본 뒤 국수를 다시 봤다.
대멸(큰 멸치)과 디포리(밴댕이의 방언)로 맛을 낸 육수도 기가 막혔다.
뒤늦게 안 국수의 깊은 맛이란.... . 그런데, 아쉬운 게 있었다.
"태백에서 자란 고냉지 배추"라 쓴 원산지 표시안내 문이었다.
그냥 값 치르고 나오면 될 것을
주인에게 "고냉지는 '고랭지'라 하는 게 맞다"라는 한 마디를 건넸다.
'첫 음이 아니니 찰 랭(冷)을 두음 법칙과 무관하다'는 설명은 덧붙이지 않았다.
얼마 뒤 다시 찾은 그 국숫집 안내문은 '고랭지'로 바뀌었다.
환하게 웃으며 "바꾼 거 보셨지요?" 하는
주인의 말이 시원한 국수 국물보다 고맙고 반가웠다.

이런 느낌은 천 원짜리를 꼬깃대던 어르신들이 사람 수보다 적게 만두를 주문하자 주인이 서비스라며 상 가득 만두를 내놓는 걸 보고 더 강해졌다. 괜한 지적한 게 아닌가 싶어 찜찜했던 내 마음을 풀어 준 것은 이렇듯 넉넉한 주인의 인심이었다.
# 심장에서 나온 것은 손에서 나온 것보다 위대하다. / 베두인 족 속담
- MBC사우회 카페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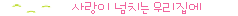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