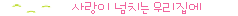|
[특파원 칼럼] 기왕이면 '無세금'까지
 ◀ 김홍수 파리 특파원 ◀ 김홍수 파리 특파원 국내의 복지 논쟁을 지켜보다 한 석학의 충고가 떠올랐다. 작년 6월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만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아마티아 센(78) 교수로부터 들은 충고다. 인도 출신 센 교수는 한평생 빈곤·분배 문제를 연구해 1998년 아시아인 최초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인물이다.
그에게 성장과 분배 간 조화를 이루는, 한국이 모델로 삼을 만한 나라를 꼽아달라고 청했다. "한국 사회를 잘 몰라서…." 선뜻 답을 내놓길 주저하기에 질문을 바꿨다. "스웨덴 등 북유럽 모델은 어떠냐"고. 그의 답은 이랬다. "우선 한국민들이 소득의 50%를 세금으로 기꺼이 내놓을 각오가 돼 있는지부터 자문해 봐라."
노(老)학자의 충고는 두고두고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우리 국민은 선진국형 복지에 따르는 부담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을까? 사회적 연대의식이 빈약한 한국인의 행태와 기존 복지선진국의 문제점을 겹쳐서 보면 걱정이 앞선다.
프랑스에선 아이를 공립학교에 보내면 교육비는 공짜지만 점심값은 내야 한다. 점심값은 부모 소득에 비례해 책정되는데, 한국에서 나온 주재원들은 대개 소득을 축소신고해 점심값을 자기 능력에 비해 덜 내는 것을 당연시한다. 좀 다른 경우지만 파리의 한식당들은 매출을 축소 신고하는 탓에 프랑스 세무 당국의 '단골 표적'이 되고 있다.
한국에선 유럽의 '무상(無償)'의료를 부러워하지만 정작 유럽에선 제도 개혁을 고심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저소득층 600만명에게 무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장인의 의료보험료(월소득의 0.75%·본인분담금 기준) 부담이 한국(2.82%)보다 훨씬 낮다. 이런 제도가 마냥 잘 돌아가면 좋겠지만 프랑스의 의료보험 적자(2010년 기준 230억유로·35조원)는 더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 기존 의료보험 제도는 불필요한 과잉진료와 그로 인한 사회적 낭비도 초래하고 있다.
유럽형 복지 제도는 기본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의 '연대의식'과 '상호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당국을 속여서 '덜 내고 더 받으려는' 행태는 확실히 적다. 그런데도 제도 설계 자체가 잘못된 탓에 이제는 복지 때문에 무너지는 나라들이 속출하고 있다. 불황으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이제는 유럽에서도 복지 수혜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프랑스에선 연금수령자가 사망하고도 가족이 이를 숨긴 채 연금을 계속 타가는 사례가 급증하자, 연금수령자에게 매년 '생존증명서'를 내도록 했다.
한평생 복지 문제를 연구한 석학도 선뜻 답을 내놓지 못하는 난제가 복지인데, 한국 정치인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마치 풀기 어려운 매듭을 단칼에 자르고 큰소리친 알렉산더 대왕이라도 되는 것 같다. 한국에서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교육까지 경쟁적으로 난무하는 것을 보면서 이러다 언젠가는 '무(無)세금'으로 '완결판'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 입력 : 2011.01.16
|
'생활의 양식 > 시사,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YS, '5,18 특별법', 재심에 앞장서야 (0) | 2011.01.25 |
|---|---|
| [아침논단] 한 명 세금 갖고 두 명 먹고 사는 스웨덴 (0) | 2011.01.22 |
| 첫 글자의 진리 / 김정일,김정은 (0) | 2011.01.16 |
| 월남학생은 울었다 (0) | 2011.01.15 |
| 통일비용(統一費用) 논란을 끝낸다! (0) | 2011.01.0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