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暴雪) - 詩 오탁번
삼동(三冬)에도 웬만해선 눈이 내리지 않는
남도(南道) 땅끝 외진 동네에
어느 해 겨울 엄청난 폭설이 내렸다
이장이 허둥지둥 마이크를 잡았다
― 주민 여러분! 삽 들고 회관 앞으로 모이쇼잉!
눈이 좆나게 내려부렸당께!
이튿날 아침 눈을 뜨니
간밤에 또 자가웃 폭설이 내려
비닐하우스가 몽땅 무너져내렸다
놀란 이장이 허겁지겁 마이크를 잡았다
― 워메, 지랄나부렀소잉!
어제 온 눈은 좆도 아닝께 싸게싸게 나오쇼잉!
왼종일 눈을 치우느라고
깡그리 녹초가 된 주민들은
회관에 모여 삼겹살에 소주를 마셨다
그날 밤 집집마다 모과빛 장지문에는
뒷물하는 아낙네의 실루엣이 비쳤다
다음날 새벽 잠에서 깬 이장이
밖을 내다보다가, 앗!, 소리쳤다
우편함과 문패만 빼꼼하게 보일 뿐
온 천지(天地)가 흰눈으로 뒤덮여 있었다
하느님이 행성(行星)만한 떡시루를 뒤엎은 듯
축사 지붕도 폭삭 무너져내렸다
좆심 뚝심 다 좋은 이장은
윗목에 놓인 뒷물대야를 내동댕이치며
우주(宇宙)의 미아(迷兒)가 된 듯 울부짖었다
― 주민 여러분! 워따. 귀신 곡하겠당께!
인자 우리 동네 몽땅 좆돼버렸쇼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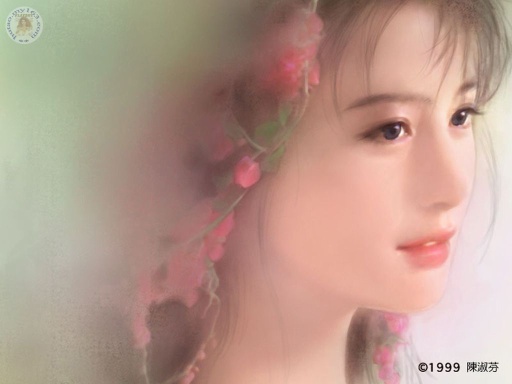
새끼들 - 정성수
술판이 무르익자 점잖던 김 교수님이
- 그 좆새끼가 나만 보면 갈궈. 요새, 미치겠네.
- 그 씹새끼 상대하지 마.
이 박사가 한 수 거든다.
참, 때로는 인격도 바닥을 치는구나.
죽합(竹蛤) 하나를 초장에 찍으면서 이박사가
- 고놈, 여기 있네. 자, 한 입. 씹어 봐. 맛이 어떤가.
김 교수님, 조갯국물을 뜨다말고 실눈을 그리더니
-완전히 좆같네
좆이란 원래 그렇잖은가.
흐믈흐믈 해삼 같다가도 어느 새 틀실한
고구마가 아니던가.
씹은 또 어떻고
그 앞에서야 너나 할 것 없이
체면이고 인격이고 다 죽었다 살았다
엄청난 위안이지.
어디 세상에 새끼 아니었던 것 있었던가.
좆새끼 아니면 씹새끼지.

오탁번 시인은 우리 사회의 근엄주의는 물론 우리 시의 근엄함마저도 확실하게 깨부수고 있다. 그의 시는 대체로 쉽다. 특히 <폭설>이라는 제목의 이 시는 쉬움을 넘어 웃음을 참지 못하게 한다. 처음 읽을 때 ‘좆나게 내려부렸당께’나 ‘워메, 지랄나부렸소잉’ ‘좆돼버렸쇼잉’ 등 이장의 직설적인 전라도 사투리가 코미디를 볼 때보다 더 큰 웃음을 준다. 시를 읽고 웃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다.
이 시의 끝은 웃음이 아니다. 웃음을 접고 다시 한번 읽으면 서로 보듬고 사는 우리 농촌 주민의 생활상에 ‘아름답다’는 단어가 떠오르고, 폭설에 삶의 터전이 무너진 농부들의 안타까운 심정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그래서 한번 읽을 때 웃고, 두번 읽으면 슬퍼지는 시 <폭설>은 우리 시의 근엄주의를 일시에 무너뜨린 대표적인 수작(秀作)일 것이다. - 황인원 선임기자(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