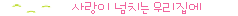|
그 詩가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이동원의 '향수'만 있는게 아니랍니다… 10가지 버전
지금은 누구나 부를 수 있지만, 1988년 납-월북 작가 해금 조치 전까진 입 밖에 낼 수도 없었던 시. 정지용의 '향수'다. 그를 기리는 '향수 열차'와 문학콘서트 축제가 그의 고향인 충북 옥천에서 오는 15~17일 열린다.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그동안 수없이 많은 가수들이 혼자, 듀엣으로, 때론 합창으로 이 시를 부르곤 했다. 바닥부터 목소리를 끌어올리는 듯한 조영남, 비단 결을 걷는 것 같은 주현미의 목소리, 그리고 심연을 울리는 뮤지컬 배우 임태경까지. 여러 버전으로 재탄생된 '향수'를 즐겨보시길.
이성·감성·靈性을 두루 섞어 독자를 황홀하게 만든 정지용 鄕愁열차·문학콘서트 축제가 15~17일 고향 옥천서 선보여 詩作 읽고 그를 떠올린다면 마음은 천국을 노닐 것이니
" 망토 깃에 솟은 귀는 소라 속같이 소란한 무인도의 각적(角笛)을 불고…."
정지용 (1902~1950)의 시 '해협(海峽)'의 일부다. 내가 태어나서 처음 접한 정지용의 시구(詩句)였다. 1980년대 초 대학생 시절, 어느 날 어느 선배가 그렇게 정지용의 시 일부를 외웠다. "솟은 귀는 소라 속같이 소란한…. 이렇게 시옷 소리가 숨 가쁘게 이어지면서 소라 껍떼기를 비비는 소리와 해조음(海潮音)이 울리지 않니? 정지용의 시다. 참으로 언어 감각이 예민한 시인이었다." 그는 더 이상 말해주지 않았다. 정지용이 누군지.
그 당시 정지용은 '금서(禁書)의 시인'이었다. 그는 6·25전쟁 때 강제 납북돼 사망했지만 해방 직후 좌파 문인단체에 잠시 가입한 전력 때문에 월북자로 낙인찍혔다. 나는 은밀하게 나돌던 정지용 시집의 복사본을 구하러 다녔다. 손에 넣자마자 '망토 깃에 솟은 귀는…'이란 대목을 숨 가쁘게 찾았다. 오랫동안 짙은 해무(海霧)에 가렸던 바다가 푸른빛을 뿜어내며 망막을 가득 채웠다. 오호라, 시 제목이 '해협'이었구나.
"포탄으로 뚫은 듯 동그란 선창으로/ 눈썹까지 부풀어오른 수평이 엿보고"라며 시작하는 시를 처음으로 온전히 읽었다. 충북 산골에서 태어난 정지용이 일본 유학을 떠나 처음 바다를 본 추억을 회화(繪畵)처럼 묘사한 언어의 연금술이 놀라웠다. 정지용 시집을 독파하고 난 뒤 그의 시 '향수(鄕愁)'의 후렴구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가 입속에서 맴돌았다. 1988년 정부의 납·월북 작가 해금(解禁) 조치 이후 정지용의 시에 곡을 붙인 '향수'는 아무 데서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됐지만 1980년대엔 밖으로 소리 낼 수 없는 시였다. 그렇게 읽던 시를 차마 꿈에서조차 잊겠는가.
정지용은 '한국 현대시의 아버지'로 꼽혀 왔다. 김지하 시인은 정지용을 가리켜 '이성과 감성, 영성(靈性)을 통합한 예술가'라고 평했다. 그는 '흰 그늘의 미학을 찾아서'란 책에서 "빛을 품은 어둠, 뭔가 안에서 큰 외침을 가지고 있는 듯하면서도 자기가 애써 억누르고 있는 침묵이 바로 '흰 그늘'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흰 그늘'의 선구자로 정지용을 꼽았다. 정지용은 어린 아들을 병으로 잃고 쓴 시 '유리창'에서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라고 애통해했다. 김지하는 "외로운 황홀, 그것은 흰 그늘이고, 신(神)을 향한 호소다. 가톨릭적이다"라며 "정지용의 시 세계에선 민족적 서정, 가톨릭, 모더니즘이 따로 놀면서도 말썽 없이 잘 얽혀들어 있다"고 감탄했다.
유종호 예술원 회장은 "20세기 한국의 시인 가운데서 우리말의 발굴과 조직과 세련에서 가장 세심하게 공들여서 독자를 황홀케 한 최초의 시인이 정지용"이라고 말했다. 유 회장은 정지용의 시 '고향'에 나오는 '높푸르다'처럼 그가 처음 쓴 말이 적지 않다고 했다. 정지용은 충청도 방언도 잘 활용했다. 그가 애용한 단어 중 '누뤼'는 '우박'의 사투리다. '빗방울 나리다 누뤼알로 구을러'라고 사용했다. "유음(流音)으로 된 '누뤼알'이 '구을러'와 더 잘 어울리기 때문에 굳이 토속어를 썼다"고 유 회장은 풀이했다.
최동호 경남대 석좌교수가 최근 '정지용 전집'(전 2권)을 엮어 냈다. 1988년 김학동 서강대 명예교수가 엮은 '정지용 전집'에 비해 시와 산문 100여 편이 더 늘어났다. 정지용이 발표해 놓고도 책으로 묶지 않은 시와 산문, 일본어로 쓴 시의 우리말 번역본, 영어로 쓴 도지샤(同志社)대학 졸업 논문 등이 새 전집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최동호 교수는 1970년대에 정지용의 시를 처음 읽었다. "당시 금서였던 '지용 시집'을 처음 인사동 고서점에서 구입하여 눈 내린 밤이 깊어지는 것도 모르고 읽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그날 밤의 감동을 잊지 못해 결국 2002년부터 '정지용 전집' 정본(定本)을 만드는 작업에 매달렸다. 오랜 뚝심 끝에 시집과 산문집 각각 700쪽이 넘는 전집을 출간했다.
정지용은 1902년 음력 5월 15일 충북 옥천에서 태어났다. 새 전집은 옥천군이 15~ 17일 정지용 시인을 기리는 제28회 지용제(芝溶祭)를 여는 때에 맞춰 나왔다. 옥천문화원은 16일 서울역~옥천역을 왕복하는 '향수(鄕愁) 열차'도 운행한다. 고은·신경림·문태준 등 시인 70여 명과 행사 참가를 신청한 일반인 350명이 오전 6시 30분 서울역에서 전용 열차를 타고 옥천에 내려와 정지용 생가를 둘러보고 문학 콘서트에도 참여한다.
정지용은 영국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를 전공했다. 그는 "마음으로나 생각으로 천국을 여행해보지 않은 사람은 예술가가 아니다"는 블레이크의 말을 논문에 인용했다. 예술가는 상상력의 극점(極點)에서 천국 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술 애호가도 마찬가지다. 정지용 애독자라면 지용제 구경을 가거나 새 전집을 펼쳐보면서 나름대로 상상력의 극점에 이를 수 있다. 문득, 옥천이 고향도 아닌데도 그립다.
조선일보 2015.05.14 박해현 문학전문기자
|
'음악의 산책 > 우리음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그 여인 - 조광선 (0) | 2018.03.21 |
|---|---|
| 술이야-장혜진,윤민수,바이브 (0) | 2017.01.28 |
| 봄날은 간다 / 조용필,장사익,주현미 (0) | 2015.05.15 |
| 꿈의 아리랑, 홀로 아리랑 / 조용필 '평양 콘서트' (8.23) (0) | 2015.02.25 |
| 김대성,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김광석 원곡 감동 (0) | 2014.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