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은등뻐꾸기 울음
그제 어린이날 포천 어느 수목원에 갔다가 그 새소리를 들었다.
앞산 뒷산에서 문답하듯 '카카카코' 울었다.
네 마디 소리 중 셋은 같은 음이다가 마지막 하나는 뚝 떨어진다.
음계로 치면 미·미·미·도쯤이다.
'뻐꾹 뻐꾹' 하는 뻐꾸기 소리보다 조금 낮아 더 울림 있다.
숲이 연두에서 초록으로 짙어 가는 요즘, 여름이 온다고 알리는 검은등뻐꾸기다. 이 여름 철새는 늦봄에 찾아와 번식하고 가을이면 따뜻한 곳으로 떠난다.
검은등뻐꾸기도 다른 새 둥지에 몰래 알을 낳아둬 부화시키고 키우게 하는 얌체다.
뻐꾸기보다 등 빛깔이 어두워 그런 이름이 붙었다.
그 울음을 칠팔년째 5월마다 과천 서울대공원 산림욕장에서 듣는다.
순환로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걷기 시작해 얼마 안 가 길 오른쪽 숲에서다.
음정이 민요 '옹헤야'의 후렴 앞소리 '어절씨고'를 빼닮았다.
새가 '어절씨고' 하면 우리는 얼른 '옹헤야'라고 뒷소리를 받쳐준다.
'잘도 한다' 하면 또 '옹헤야' 하고. 봄 산 걷기가 더 신바람 난다.

검은등뻐꾸기 울음엔 '소쩍 소쩍' '뻐꾹 뻐꾹' 같은 의성어가 따로 없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게 듣는다.
'첫차 타고 막차 타고' '언짢다고 괜찮다고' '혼자 살꼬 둘이 살꼬'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작작 먹어 그만 먹어'….
스님 귀엔 '머리 깎고 빡빡 깎고'로 들린다는 우스개도 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시인 임보는
'만어(萬語)를 품고 있는 저 무궁설법 누가 따라잡을 수 있단 말인가'라고 했다.
가장 흔한 별명은 '홀딱벗고 새'다.
어쩌다 이리 야한 이름을 얻었을까.
울음이 '홀딱벗고 홀딱벗고'로 들려서란다.
등산객·골프객들의 짓궂은 장난기가 배 있다.
서화가이자 수필가 원성 스님은
'공부는 안 하고 게으름 피우다 떠난 스님이 환생했다는 전설의 새'라고 해석한다.
'욕심도 성냄도 어리석음도 홀딱 벗어버리고 열심히 공부해 성불(成佛)하라'는
소리라고 했다.
검은등뻐꾸기 울면 보리가 여물어 거둘 때다.
옛 민초들에겐 지긋지긋한 보릿고개 드디어 넘었다는 기쁨의 노래로 들렸을 것이다.
그래서 보리새라고 불렀다.
'옹헤야'는 경상도에서 초여름 보리타작할 때 부르던 노동요(謠)다.
두 타작 패가 신명나는 자진모리로 앞소리·뒷소리를 주고받았다.
장단 맞춰 도리깨 휘두르고 내리쳤다.
어제가 입하(立夏)였다. 여름과 함께 온 검은등뻐꾸기 소리에 맞춰 산길을 걷는다. '저절씨고 옹헤야, 잘도 논다 옹헤야….' 그러자면 봄날은 가도 그리 슬프지 않다.
-오태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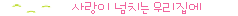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