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을 갖지 않은 사람
/ 법정 스님

지난번 태풍으로 인해 오두막으로 가는 다리가 떠내려갔다.
다리라고 해야 통나무 서너 개로 얼기설기 엮어
개울 위에 걸쳐 놓은 것인데
개울물이 불어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태풍이 오던 그 무렵은
마침 여름 안거 끝이라 나는 밖에 나와 있었다.
태풍이 휩쓸고 간 뒤 개울에 다리가 사라진 것을 보고
허망하고 당황했다.
평소 무심코 건너다니던 다리의 실체를
새삼스레 인식하게 되었다.
이쪽과 저쪽을 이어주는 다리가 없으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
세계는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리는 만나서 정겨운 나누는 일이다.
그래서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나옴직하다
다리가 유실되자 한동안 나는 떠돌이가 되었다.
영동지방의 참담한 수해 현장을 여기저기 살펴보면서
자연과 인간의 상관관계를 깊이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전이라고 해서 이와 같은 재해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전지구적으로 빈번해지고 있다.
세상의 종말을 예고한듯하여 두려움마저 든다.
인간이 자연의 힘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 낸 과학 기술이
오히려 자연환경 파괴를 불러들이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무력감을 느낀다.
한동안 환경론자들에 의해 주장되었던
‘전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자’는 표어가
이제는 절실한 삶의 철학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한
슈마허의 다음과 같은 경고를 명심해야 한다.
‘경제적 진보는 적정한 정도까지는 선하지만,
그것을 넘어설 경우에는 파괴적이고 비경제적인 악이 된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로
그 적정한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다.
그는 모든 것에 절제를 요구하는 불교의 지혜,
즉 중도(中道)를 실천하자고 주장한다.
다리가 떠내려간 뒤 일정한 거처 없이 여기저기 떠돌면서
새삼스레 ‘출가자’란 말이 문득 떠올랐다.
출가자란 자신이 살던 집을 버리고 나온 사람이란 뜻이다.
그러니 달리 표현하자면 집이 없는 사람이다.
자신의 집(소유)을 갖지 않은 사람이다.
현재의 거처는 나그네로 한때 머물고 있을 뿐,
그러기 때문에 출가자는
한때 머무는 그 주거 공간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추석 무렵 그 출가자는 지리산에 올랐다.
새로 산 등산화를 신고 예전에 올랐던 그 산길을 걸었다.
고무신을 신고 올랐던 그 산길을
등산화를 신고 걸으니 든든했다.
일기예보는 추석 무렵 전국적으로 비가 내려
추석 달을 볼 수 없을 거라고 했는데
지리산에서는 4박5일 동안 날마다 밝은 달과 마주할 수 있었다.
산에서 보는 보름달은 더욱 정답다.
풀벌레 소리와 이따금 푸석거리며 지나가는 산짐승들의 움직임이
산에서 맞는 달밤을 한결 그윽하게 거들었다.
아침으로는 산골짜기마다 안개와 구름으로 별천지를 이루었다.
숲 속에 머루와 다래는 아직 덜 익었지만
밤나무 밑에는 여기저기 알밤이 떨어져 있었다.
밤 줍는 재미에 산길은 더욱 정겹고 풍요로웠다.
산 능선 길에는 억새꽃이 가을바람에 파도처럼 일렁거렸다.
자연을 이렇듯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무상으로 베풀고 잇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연의 이런 은혜도 모르고
끝없이 허물고, 빼앗고, 더럽히고 있으니
‘우주의 기운’이 언제까지 참고만 있겠는가.
전지구적인 재앙의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저마다 서 있는 자리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태풍으로 인해 자취 없이 사라진 다리가 있던 자리에
이제는 통나무를 걸쳐 놓을 엄두가 나지 않는다.
개울이 많이 씻겨 내려가 그 폭이 너무 넓어졌기 때문이다.
산동네 사람 몇이서 힘을 모아
최근에야 물길이 옅은 곳에 징검다리를 놓았다.
징검다리는 비가 많이 오면 이내 잠수교가 될 것이다.
개울물에 띄엄띄엄 놓은 그 징검다리를
징검징검 딛고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오두막 둘레의 개울도 아주 낯설게 변해 있었다.
눈에 익은 큰 돌들이 사라지고 난데없이 바위가 굴러와 있었다.
그리고 개울가의 돌담이 절반쯤 무너져 내렸다.
방문을 활짝 열어젖히니
방안에 귀뚜라미 몇 마리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 밤의 친구들이다.
아궁이에서 젖은 재를 쳐내고 군불을 지피는데
아궁이 속이 눅눅해서 불이 잘 들이지 않는다.
한참을 부채질해서 불을 붙여 놓았다.
그새 가을바람에 숲이 성글어졌다.
붉나무에는 벌써 가을이 내리고 있다.
개울가에 피어 있음직한 용담은 토사에 묻혀 보이지 않는다.
방을 치우고 여름동안 비워두었던 벽에 액자를 하나 내걸었다.
언젠가 원공거사(圓空居士) 송영방 화백이 내 책 표지화로 그려준 것인데
담채 반추상으로 그린 연꽃 그림이다.
 그 여백에 내가 화제(畵題)를 써 놓았다. 그 여백에 내가 화제(畵題)를 써 놓았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숫타니파타》의 ‘무소의 뿔’장에 나오는 구절인데
초기불교에서 출가자가 처신해야 할 생활태도에 대해서
말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세상에 살면서도 거기에 걸리거나 물들지 말라는 교훈이다.
그전문은 다음과 같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홀로 사는 즐거움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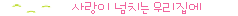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