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색채 없는 철종씨의 팔월 한가위
남들에겐 '태산'이라는 아버지… 나에겐 사고만 치는 '폭탄'이네
변변한 직업 없는 정치 백수… 그래도 “사나이란 야망 있어야”
추석을 코앞에 두고 병실에 누웠네… 아버지는 웃고, 아들은 우네
철종씨가 자기 아버지의 눈물을 본 건 중2 때였다.
선산에 할머니를 묻고 온 날이었다.
삼복더위에 이불을 뒤집어쓰고 흐느끼는 중년의 사내를 보았다.
나이 든 남자도 운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딸 셋 내리 낳고 건진 3대 독자가 군대 가던 날에도 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혔다.
6개월 방위였다.
이웃에선 코웃음을 쳤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뒤통수가 사라질 때까지
목이 꺾어져라 손을 흔들었다.
훈련소에서 받은 아버지의 편지는 '자랑스러운 대한의 아들아!'로 시작되었다.
글자 몇이 얼룩져 있었다.
#
아버지의 눈물이 철종씨의 가슴을 적신 건 아니었다.
남들은 아버지가 태산 같은 존재라는데, 그에겐 위태로운 벼랑이자,
언제 터질지 모를 폭탄이었다.
휴대폰에 고향집 전화번호가 뜰 때마다 그의 새가슴이 내려앉았다.
대기업에 입사한 아들의 명함으로 만사를 해결하려는 아버지였다.
하다못해 밥집에서 외상을 그을 때에도 “내 아들이 서울 대기업 과장인디~”
하며 생짜를 부렸다.
기울어가는 천석꾼 집안의 외아들로 태어난 아버지는
정의감이나 책임, 염치 따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백바지에 백구두를 즐겨 입는 백수건달이자,
매사에 난센스가 작렬하는 사내였다.
‘운동회’란 말에 그가 경기(驚氣)를 일으키는 까닭은,
초등학교 3학년 운동회 날 황색 부츠에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난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2인3각 경기를 하다 부츠 끈에
다리가 엉켜 코가 깨진 사건 때문이다.
4H 청년회장입네, 호국청년단장입네,
안 써도 그만인 감투만 좇아 다니는 폼생폼사 인생이었다.
증조부가 독립운동 자금원이었다는 사실이 유일한 정치 밑천이었다.
족보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민정당에서 평민당으로, 민주당에서 국민당으로
너무 자주 버스를 갈아타는 바람에 실속이 없었다.
#
허세가 한풀 꺾인 건, 외아들 대학 등록금에 쓰려고 남겨둔
마지막 논마지기를 선거판에 쏟아부은 뒤였다.
할 줄 아는 게 운전밖에 없어서 버스 회사에 취직했다.
정치에 대한 미련을 접은 건 아니었다.
역사의 산증인이 되겠다며 아버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누가 봐도 백수 일기로되,
당신에겐 난중일기보다 치열하고 백범일지보다 거룩했다.
사위어가던 정치 본능을 일깨운 건 노조위원장 선거였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약간의 돈과 약간의 거짓말로 위원장 자리를 꿰찼다.
거기서 멈췄어야 했다. 영웅이 되고 싶었던 아버지는 강성 노조를 선언했고,
칠순의 버스 회사 사장을 노조원들 앞에 무릎 꿇렸다가 역풍을 맞았다.
한 달이 멀다 하고 사고 소식이 들려온 건,
아버지가 버스 대신 택시를 몰기 시작한 후부터다.
과속에 승차 거부, 주차 위반까지 벌금 고지서가 나오는 족족
아버지는 철종씨에게 계좌 이체를 통지했다.
택시엔 승객뿐 아니라 별다방 미스 김도 태우고,
양조장 과부댁도 태워서 어머니의 속을 뒤집었다.
당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을 욕한 승객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아버지를 유치장에서 꺼내기 위해 밤길을 내달리면서 철종씨는
‘내 인생에 저 폭탄은 언제쯤 사라지나’ 원망하고 원망했다.
“한번 다녀가야겄다.” 지난 주말 어머니에게 걸려온 전화였다.
의사는 파킨슨병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2년 전부터 진행됐는데 눈치채지 못했느냐고 핀잔을 주었다.
아버지의 이마와 턱, 그리고 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다.
경운기를 추월하려다 가로수를 들이받았다고 했다.
근육이 마비돼가고 있었다.
그 와중에도 머리에 박힌 유리 파편을 손으로 뽑고 나왔노라며
병상의 아버지가 무용담을 늘어놓았다.
서울 큰 병원 가서 정밀 진단 받으라는 의뢰서를 받아든
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검버섯 핀 얼굴로 히죽 웃었다.
교통사고로 부러진 앞니도 함께 웃었다.
바람 새는 소리로 느닷없이 아버지가 속삭였다.
“사랑한다, 아드을~.”
늙은 어머니가 혀를 찼다.
“인자 노망까지 들었다. 아무나 보고 저런다.”
#
불사조였던 아버지를 죽음이란 단어와 연결해본 적이 철종씨에겐 없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나 진지함 따위는 그의 아버지에게 없었다.
무지하여 방향이 없었을 뿐,
아버지는 막 잡아올린 활어처럼 언제고 살아 펄떡였다.
만취해 귀가한 아버지는 자정이 넘도록 책 나부랭이를 붙잡고 있는
아들의 등짝을 후려치며 주정했다.
“사내자식이 물러터져서는, 근성도 야망도 없이 흐리멍덩해서는….
어디 가서 고스톱도 치지 마라. 패 돌아가는 게 얼굴에 다 보이느니.”
지난해 아버지를 여읜 선배는 풀숲 이슬처럼 허무한 게 인생이더라고 했다.
맥없이 어린애 장난 같은 꽃신 신겨드리며 후회하지 말고
살아 계실 때 원 없이 사랑해드리라고 했다.
그러고 보니 적막하게 굽은 아버지의 등을 밀어드린 지 10년도 넘었다.
“피 난다, 좀 살살 밀어라” 하던
늙은 사내의 엄살이 그 얼마나 통쾌하고도 서러웠던가.
소주잔 위로 아들의 뜨거운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졌다.
조선일보 김윤덕 여론독자부 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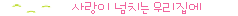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