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느 날 - 김상옥
구두를
새로 지어
딸에게 신겨주고
저만치
가는 양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한 생애
사무치던 일도
저리 쉽게 가겠네

[아! 나의 아버지] 김상옥 시인이 남긴 유산, 아름다움
‘ 봉선화’, ‘낙엽’ 등의 작품으로 유명한 우리나라의 대표 시조 시인 초정 김상옥은 내 아버지다. 어린 시절은 유명하고 훌륭하신 분이 아버지여서 좋겠다는 시샘 속에 지나갔다. 그래서 한창 예민한 사춘기에는 아버지의 특별함이 부담스러워 평범함을 바랐던 적도 있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햇빛이 강하면 어둠이 짙은 것처럼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버지와 다른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던 적도 있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햇빛이 강하면 어둠이 짙은 것처럼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버지와 다른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먼 길을 돌아 왔을 뿐 아버지가 남기신 예술가의 정신을 이어받은 딸로 살고 있다. 아버지의 작품 중에 개인적으로 아버지를 추억하게 하는 시가 두 편 있다. 첫 번째는 ‘무연(無緣)’이란 시다.
‘뜨락에/ 매화 등걸/ 팔꿈치 담장에 얹고// 길 가던/ 행인들도/ 눈여겨보게 한다// 한솥에/ 살아온 너희는/ 언제 만나 보것노.’
이 시를 처음 접했던 중학생 때는 ‘혈연인 우리 가족이 남보다 못한 타인인가’하는 생각에 아버지에게 배신감을 느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식구들과 진정으로 소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다. 시를 쓰는 일이 복되지만 생활은 어렵다며 가장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손이 붓고 팔을 다칠 만큼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렸던 아버지.
‘구두를/ 새로 지어/ 딸에게 신겨주고/ 저만치/ 가는 양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한 생애/ 사무치던 일도/ 저리 쉽게 가겠네.’ ‘어느 날’이라는 이 시는 읊조릴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
그날은 아버지와 함께 맞춘 구두를 찾으러 간 날이었다. 아버지는 옷과 구두를 직접 디자인해 나에게 입히실 만큼 미적 감각이 남다른 분이셨다. 아버지는 모처럼 다방에서 향이 좋은 커피를 함께하면서 새 구두 디자인에 대한 찬사와 함께 딸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 마음이셨지만, 나는 새 구두를 신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약속이 있다며 가버리고 말았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그날 홀로 앉아 시를 써 내려가셨을 생각을 하면 다시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마저 든다. ‘아름다움.’ 아버지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가장 강력한 단어다.
아름다움은 아버지에게 진리나 선함보다 앞서는 절대적 가치였다. “아름다움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것은 귀한 돈을 주고 사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되돌아보니 내 삶의 중요한 지표가 되어 있었다.
2004년 10월 31일 어머니 묘소에 다녀온 그날 오후 ‘벼락 치듯이’ 먼 길을 떠나버린 아버지…. 특별한 성품을 지닌 특별한 분이셨기에 생전에는 늘 사랑과 미움의 마음이 엇갈렸다. 어리석게도 날이 갈수록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만 깊어간다.
그리움이 깊어질 때면 아버지가 직접 만들어 주신 옷·구두·장신구 생각이 났다. 그러다 불현듯 아버지의 나이가 되고 난 뒤에야 그분이 내게 남긴 유산이 무엇인지 알았다. 소소하게 시작한 장신구 작품들을 모아 얼마 전 생애 첫 전시회를 열었다.
남들은 예순도 넘은 나이에 무슨 힘이 있어 도전하고 인생을 새롭게 사느냐고 묻지만,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사랑 덕분이다. 내 첫 전시회를 보신 아버지가 하늘에서 어떤 아름다운 시를 노래하셨을지 궁금하다.
<김훈정 장신구 디자이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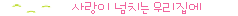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