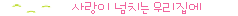|
법정 스님의 가을 이야기
조금 차분해진 마음으로 오던 길을 되돌아볼 때 푸른 하늘 아래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나무들을 바라볼 때 산다는 게 뭘까 하고 문득 혼자서 중얼거릴 때 나는 새삼스레 착해 지려고 한다.
나뭇잎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엷은 우수에 물들어간다.
가을은 그런 계절인 모양이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의 대중가요에도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그런 가사 하나에도 곧 잘 귀를 모은다.
지금은 어느 하늘 아래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의 안부가 궁금해진다.
깊은 밤 등하에서 주소록을 펼쳐 볼 친구들의 눈매를 그 음성을 기억해낸다. 가을은 그런 계절인 모양이다.
한낮에는 아무리 의젓하고 뻣뻣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해가 기운 다음에는 가랑잎 구르는 소리 하나에 귀뚜라미 우는 소리 하나에도 마음을 여는 연약한 존재임을 새삼스레 알아차린다.
이 시대 이 공기 속에서 보이지 않는 연줄로 맺어져
서로가 믿고 기대면서 살아가는 인간임을 알게 된다.
낮 동안은 바다 위의 섬처럼 저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던 우리가 귀소의 시각에는 같은 대지에 뿌리박힌 존재임을 비로소 알아차린다.
상공에서 지상을 내려다볼 때 우리들의 현실은 지나간 과거처럼 보인다.
이삭이 여문 논밭은 황홀한 모자이크 젖줄 같은 강물이 유연한 가락처럼 굽이굽이 흐른다. 구름이 헐벗은 산자락을 안쓰러운 듯 쓰다듬고 있다. 시골마다 도시마다 크고 작은 길로 이어져 있다. 아득한 태고 적 우리 조상들이 첫걸음을 내딛은 바로 그 길을 후손들이 휘적휘적 걸어간다.
그 길을 거쳐 낯선 고장의 소식을 알아오고 그 길목에서 이웃 마을 처녀와 총각은 눈이 맞는다. 꽂을 한 아름 안고 정다운 벗을 찾아가는 것도 그 길이다. 길은 이렇듯 사람과 사람을 맺어준 탯줄이다.
그 길이 물고 뜯는 싸움의 길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사람끼리 즐기고 미워하는 증오의 길이라고도 생각할 수 없다.
뜻이 나와 같지 않대서 짐승처럼 주리를 트는
그런 길이라고는 차마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미워하고 싸우기 위해 마주친 원수가 아니라 서로 의지해 사랑하려고 아득한 옛적부터 찾아서 만난 이웃들인 것이다.
사람이 산다는 게 뭘까? 잡힐 듯 하면서도 막막한 물음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
태어난 것은 언젠가 한 번은 죽지 않을 수 없는 사실
생자필멸, 회자정리, 그런 것인 줄을 뻔히 알면서도
노상 아쉽고 서운하게 들리는 말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따뜻한 눈길을 보내주고 싶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얼굴을 익혀두고 싶다.
이다음 세상 어느 길목에선가 우연히 서로 마주칠 때
오아무게 아닌가 하고 정답게 손을 마주 잡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에서 익혀두고 싶다.
이 가을에 나는 모든 이웃들을 사랑해주고 싶다. 단 한 사람이라도 서운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가을은 정말 이상한 계절이다.
- 법정 스님 -
|
'행복의 정원 > 좋은글 '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런 황혼의 삶이 되게 하소서 (0) | 2013.10.11 |
|---|---|
| 혜민 스님의 좋은 말씀 (0) | 2013.10.11 |
| 승자의 단어 ‘지금’, 패자의 단어 ‘나중’ (0) | 2013.10.03 |
|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5가지 방법 (0) | 2013.10.02 |
| 삶의 역경을 견디는 힘 (0) | 2013.10.02 |